[데스크칼럼] ‘유한킴벌리’라 쓰고 ‘기만’이라 읽는다
 [CMN 문상록 편집국장]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인 1월 13일 우리에겐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CMN 문상록 편집국장]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인 1월 13일 우리에겐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친환경적이고 바른 경영의 이미지로 2014년까지 4년 연속 우수기업인증을 받은 유한킴벌리가 배신감을 심어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퓨어아기 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메이처메이드 물티슈’ 등 4개 제품에서 잔류유해물질인 메탄올의 허용기준인 0.002%를 2배 이상 초과한 0.004~0.005% 검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회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유한킴벌리는 문제가 됐던 제품들에 대한 회수 의지가 약했다.
소비자 환불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만 가능하게 하고 반드시 회사에서 지정한 택배를 이용해야만 환불을 해주는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제품 회수에 나섰다.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고 제품을 보내려 해도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고자세(?)로 일관하면서 많은 소비자로부터 불만을 샀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제품을 회수함은 물론 문제된 제품을 판매한데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반적인 실수 정도로 넘어가려는 유한킴벌리의 태도는 소비자의 불만을 낳기에 충분했다.
그럼 유한킴벌리는 왜 이런 악수를 두었을까? 그건 바로 기업에게는 무한한 호의를 베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무른 조치가 낳은 결과다.
이번 유한킴벌리 사태에서 보여준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속 조치는 말 그대로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 항목으로 꼽는 식품의약품안전처지만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내려지는 조치는 제품 회수나 과태료가 전부다. 사후관리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흐지부지 하는 사례가 많았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다시는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정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봐주기 식의 행정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번 사태에서도 유한킴벌리 봐주기 의혹은 떨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미 2016년 11월 28일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유한킴벌리 일부 제품에 메탄올 과다 함유를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발표와 회수 조치는 45일이나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보고된 타 회사의 제품은 발표 이전부터 회수 명령을 내리는 기민함을 보였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인데 왜 유한킴벌리에겐 왜 45일이라는 넉넉한 시차를 두는 호의를 베풀었을까 한번쯤은 의문점을 가질 대목이다.
공교롭게 문제가 됐던 제품의 회수명령을 묵히고 있던 시기에 몇몇 매체를 통해 유한킴벌리 하기스가 소셜커머스 위메프와 함께 12월에 출시한 ‘알파벳 놀이 에디션’ 물티슈가 출시 한 달 만에 10만개 완판을 기록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됐다.
다른 기업에게는 그렇게 발 빠르게 회수명령을 내렸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독 유한킴벌리에게는 관대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발표를 늦추는 그 순간 동종의 상품이 판매될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일까? 의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만이 알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기업 봐주기의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법으로 가할 수 있는 제재의 한계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앞세우고 있지만 모두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기에는 궁색한 변명이다.
모두에게 공정한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로서 유한킴벌리 사태에 대한 확실한 사후관리를 기대해 본다.
[ 관련기사 리스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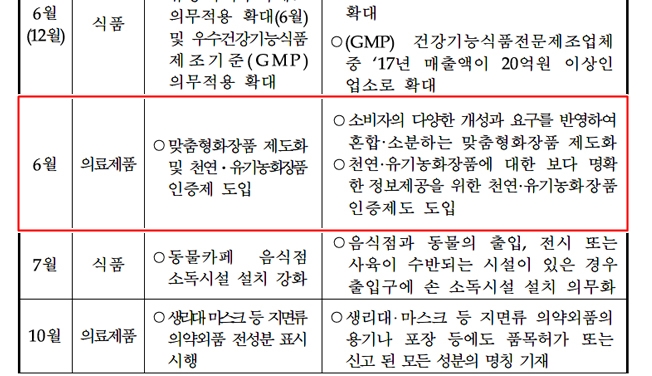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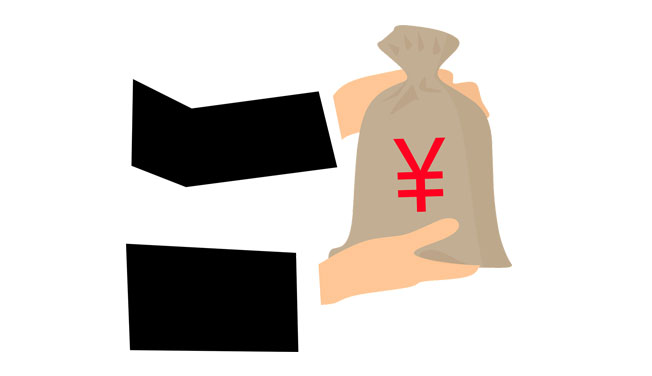

.gif)

 2026년 뷰티 시장, 정교한 ‘탐색의 시대’로 진입
2026년 뷰티 시장, 정교한 ‘탐색의 시대’로 진입 ‘수출스타 500’, 수출 국가대표 키운다
‘수출스타 500’, 수출 국가대표 키운다 2025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2월 28일까지
2025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2월 28일까지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애경산업 2025년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 6,545억
애경산업 2025년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 6,545억 닥터지, 일본 시장에 K-선케어 전파 박차
닥터지, 일본 시장에 K-선케어 전파 박차 코스맥스, ‘2026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성장기업’ 등극
코스맥스, ‘2026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성장기업’ 등극 1인 가구 결제자 많은 리테일 ‘올영·백화점·다이소’
1인 가구 결제자 많은 리테일 ‘올영·백화점·다이소’ 월마트도 주목한 K뷰티, 고위급 구매단 방한
월마트도 주목한 K뷰티, 고위급 구매단 방한 얼굴 7가지 주요 부위 탄력 리프팅 효과 입증
얼굴 7가지 주요 부위 탄력 리프팅 효과 입증





